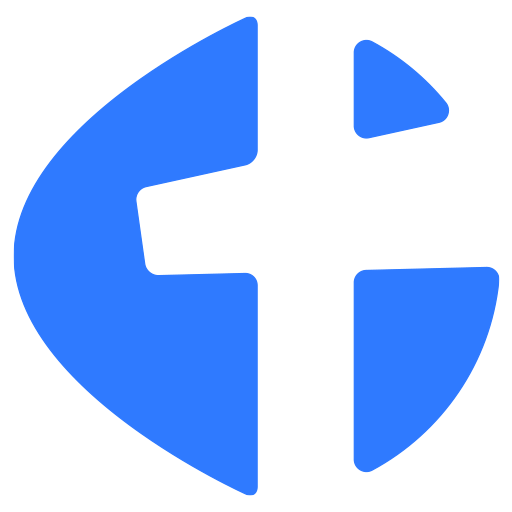로마서, 서신인가 논문인가?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 중에서도 바울 사도의 신학적 깊이를 대표하는 문서로 평가된다. 로마서는 특정 지역 교회나 개인에 대한 답변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쓰인 일반 서신과는 달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성격이 강하다. 고대 세계의 서신에는 짧은 개인 서신에서부터 철저하게 퇴고된 논문형 서신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으며, 로마서는 이러한 스펙트럼에서 학문적 논증을 담은 ‘논문형 서신’의 특성을 띤다. 이번 글에서는 로마서가 논문 형식의 서신으로 평가되는 이유와 그 장르적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로마서의 장르적 특성과 특징
1. 로마서의 서신적 성격과 일반성을 띤 논증 구조
로마서는 서문(1:1-15)과 결문(15:14-16:27)에서 고대 편지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지만, 중심 본문(1:16-11:36)과 윤리적 권면이 주를 이루는 후반부(12:1-15:13)는 논문에 가까운 형식을 지닌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특정 독자의 질문이나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서신과 달리, 특정 공동체나 개인의 필요에 맞춰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신학적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특정한 공동체의 특정 상황보다는 모든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서는 단순히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바울의 신학적 논리를 독자들이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논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로마서가 특정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문서임을 시사한다.
2. 로마서와 디아트리베 문체의 유사성
로마서는 고대의 철학적 논증 문체 중 하나인 ‘디아트리베'(diatribe)의 특징을 일부 포함한다. 디아트리베는 주로 견유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방식으로, 가상의 대화 상대와 논쟁을 통해 철학적 주제를 설명하거나 논박하는 방식이다. 바울은 로마서 2:1-3:8에서 이러한 문체를 사용해 가상의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예를 들어, 바울은 독자가 반문할 것을 예상하여 ‘메게노이토'(“결코 그럴 수 없다!”)와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증의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가 디아트리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디아트리베는 특정 논쟁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문체일 뿐, 로마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로마서는 논증적 문체 외에도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3. 로마서에 나타난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
로마서는 디아트리베 외에도 비망록(memorandum), 권면의 서신(protreptic letter), 외교적 편지(ambassadorial letter) 등 여러 고대 장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바울은 이처럼 다양한 문체적 요소들을 조합하여 독자에게 신학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비망록적 요소: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성격을 띠며, 이는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비망록 성격과 유사하다. 로마서는 특정 공동체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닌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권면의 편지적 요소: 후반부의 윤리적 교훈과 권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며, 고대 권면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권고의 특성을 반영한다.
- 외교적 편지적 요소: 로마서는 로마 교회와 유대인 및 이방인 신자들 간의 관계를 다루며 조화와 화해를 강조한다. 이는 고대 외교적 편지의 특징을 띠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로마서는 여러 장르적 요소를 혼합하여 복합적인 문체를 보여주며,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활용한 작품임을 드러낸다.
4. 로마서의 논문적 성격과 바울 신학의 방향성
로마서는 비록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학적 논증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논문적 성격이 강하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그의 신학적 관점과 교리적 원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는 특정 공동체를 넘어선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 신학 전체를 요약한 포괄적 문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나 “재림”과 같은 주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바울이 다루는 주제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등에 한정된다. 이는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전체적 요약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특정 공동체를 위해 작성된 문서임을 보여준다.
결론: 고대 문학 전통 속의 독자적 지위를 가진 로마서
로마서는 특정 장르로 정의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의 서신이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보편적인 신학적 논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적 장치와 장르적 요소들을 활용했다. 로마서는 단순한 서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학적 논문에 가까운 형태로 기독교 교리와 신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로마서를 특정한 장르에 귀속시키기 어렵게 하지만, 그만큼 바울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대의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서는 결국 고대 문학적 전통 속에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며, 그 내용과 구조는 바울 신학의 정수를 표현하는 한편, 고대 서신 문학의 정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